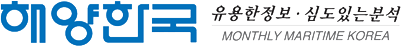삶의 고달픔 명태 처지에 빗대 만들어진 노래
1952년 부산서 ‘젊은 작곡가의 밤’ 때 오현명 불러
첫무대 실패한 작곡가 변훈 충격 받아 외교관 변신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 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 후
에지프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캬 ~)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헛~ 명태라고 헛~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이 노래는 젊지만 세파의 소용돌이에 갇혀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들의 자조 섞인 신세를 명태에 빗대 풍류아風流兒로 남고파하는 역설적 신세한탄조가 느껴진다. 한 때 명예퇴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명태’란 유머가 있었다. 노랫말이 암시하는 대로 태어나 숨질 때까지 삶을 위해 온힘을 쏟다가 죽고 나선 안주거리가 돼 몸을 기꺼이 바치고 사라진다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그런지 명태는 서민의 고달픈 삶을 많이 닮았다. 어부들에게 잡혀 북어나 동태, 생태, 황태 등으로 팔자가 나눠지는 신세가 왠지 처량하기만 하다.
이 노래는 바다생선이름이 제목으로 쓰인 게 이채롭다. 명태는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던 물고기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생선이다. 그러나 이젠 씨가 말라 수산당국이 살아있는 국산명태를 잡아오면 한 마리에 50만원을 줄만큼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
육군 종군작가였던 제주도출신 양명문 작시
그런 생선이름의 ‘명태’ 노래는 6·25전쟁 때 만들어졌다. 북한출신 변훈(1926-2000년)이 대구에 있을 때로 육군 종군작가였던 제주도출신 양명문의 시에 음을 붙여 태어났다. 그 때 변훈은 국군연락장교(미8군 통역관)로 전투에 참가 중이었다. 가곡 ‘명태’는 낙동강전투가 한창이었던 1952년 가을 부산서 열린 ‘젊은 작곡가의 밤’ 음악회 때 발표됐다. 성악가(베이스바리톤) 오현명이 굵직한 목소리로 호탕하면서도 멋지게 불렀지만 반응이 별로였다. 그 시절 서정적이고 얌전한 가곡에 익숙해져있던 관중들이 이상한 곡이라며 비웃었다. 남성적 힘이 넘치는 멜로디가 도발적으로 받아졌던 것이다. 음악평론가들이 “그게 노래냐”며 혹평을 하면서 결과는 실패였다. 그 바람에 변훈이 작곡한 ‘떠나가는 배’까지 국민들에게 잊힌 노래가 돼버렸다. 변훈은 그때의 실망과 충격으로 작곡가 길을 접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인 1953년 외무부 특채공무원으로 들어가 외교관이 됐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명태’는 변훈의 공무원 변신 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되살아났다. 그가 한동안 외국에 있다 귀국하자 ‘명태’가 뜨고 있었다. 오현명이 다시 불러 대단한 인기곡이 돼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 가곡 붐이 일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떠나가는 배’와 함께 부활된 ‘명태’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약 유명가곡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 발표회 때의 수모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그 이후 ‘오현명 하면 명태’, ‘명태하면 오현명’을 떠올릴 만큼 그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오현명 만의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어서다.
2009년 6월 24일 세상을 떠난 오현명은 생전에 “자신이 가곡 ‘명태’를 좋아하는 건 “노래에 깃든 한국적 익살과 한숨 섞인 자조, 재치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태’는 다른 성악가들도 많이 불렀지만 오현명 만큼 구수한 맛, 깊은 맛이 덜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명태’ 노래에피소드 중 흥미로운 점은 마산출신의 ‘가고파’ 작곡가 김동진도 ‘명태’를 작곡했다는 점이다. 가곡관련기록을 보면 1954년에 작곡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그는 작곡만 하고 음반으로 녹음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음악인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변훈은 함흥에서 태어나 함남중학교를 다녔다. 1954년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부영사, 파키스탄 총영사, 포르투갈 대리대사를 지냈다. 외교관 초임시절 브라질 등지의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그는 1981년 5월 외교관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명태’ 외에도 ‘낙동강’, ‘떠나가는 배’, ‘한강’, ‘설악산아’, ‘쥐’, ‘님의 침묵’, ‘초혼’, ‘설야’를 작곡했다. ‘자장가’, ‘갈매기’, 등은 작시까지 했다. 1947년 김소월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금잔디’ ‘진달래꽃’을 시작으로 윤동주 작시 ‘무서운 시간’(1948년), 시인 김광섭의 ‘차라리 손목 잡고 죽으리’(1952년), ‘나는야 간다’, 시인 정공채의 ‘갈매기 우는구나’, 조병화의 ‘낙엽끼리 산다’ 등의 노래도 만들었다.
노래제목으로 쓰인 명태는 경골어강Osteichthys 대구목Gadiformes 대구과Gadidae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서민들 밥상에 올라 반찬이 되고 술안주거리로도 인기다. 국, 찌개, 구이, 찜 등 조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려진다. 몸이 가늘고 길고, 주둥이는 뾰족하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튀어나 있다. 몸빛은 등쪽이 갈색이고 옆구리에 가운데가 끊긴 2줄의 흑갈색 세로띠가 있다. 세로띠의 가장자리는 불규칙하다. 동해안 대표어종이었던 명태는 지역, 상태, 잡는 법에 따라 이름이 20여 가지나 된다. 경기도 이남에선 북어北魚, 동해연안에선 동태凍太, 신선한 명태는 선태鮮太, 그물로 잡은 명태는 망태網太, 낚시로 잡은 명태는 조태釣太라 부른다. 새끼는 노가리라 불린다. 생태 내장을 빼내고 말린 코다리, 높은 곳에 기온이 서늘한 고랭지에서 말린 황태도 있다. 명태는 버릴 게 없다. 알은 명란젓, 창자는 창난젓, 간장은 어유魚油에 쓰인다.
우리나라의 명태잡이는 조선 후기에 본격화됐다. 1960년대 들어 우리 어선들이 북태평양으로 나가면서 어획량도 크게 늘었다. 함경남북도·강원도·경상북도 연해와 오호츠크해, 베링해, 북아메리카 서해안,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이바라키현 이북의 북태평양 연해에서 산다. 그러나 요즘 국산명태가 잡히지 않아 비상이다. 이런 가운데 명태의 종묘생산이 국내 처음 성공했다.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지난 5월 명태 치어 25만 마리를 부화시켜 5만 마리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어민으로부터 살아있는 명태종묘를 받아 해양심층수로 관리하던 어미명태와 함께 자연산란으로 부화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24일~27일 우리나라 제1의 명태고장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 11리 해변 및 거진항 일대에선 ‘제15회 고성명태축제’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