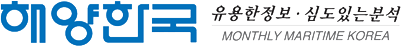한국의 최대 그룹이 롤모델로 삼았던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철저한 가족경영 체제이면서도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Esse, Non Videri) 라는 말로 가족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머스크 그룹은 덴마크 GDP의 1/5을 점할만큼 발렌베리 그룹 못지 않은 대 기업집단으로 철저한 가족 기업이지만 그룹의 경영일선에는 그룹회장을 포함, 핵심 개별기업의 사장 어디에도 가족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경영진들이 가족의 역할을 견제하려 한다거나 가족이 전문경영인의 경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 그룹의 고위임원을 Microsoft, Proctor & Gamble, Hewlett Packard 등 비해운분야에서 발탁해 오는 것도 전문경영인의 몫이며 가족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경륜을 축적하다보니 머크스 라인 출신이 경쟁선사들의 발탁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때 NOL의 최고경영자였던 Flemming Jacobs씨, 현재 Hapag LLoyds의 CEO인 Rolf Habben Jansen씨 등이 전직 머스크 라인 출신들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가족에 대한 Loyalty 보다는 Pro를, 내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과도한 순혈주의가 오히려 체력의 약화를 초래하는가 하면 조그마한 외풍에도 쉽게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글로벌 해운계를 살펴보면 해운산업은 그 성격상 가족경영체제가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러나 가족이 오너가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전방위 오너경영이 아니라 가족과 전문경영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역할 분담과 일관성 있는 정도 경영의 실천이 중요하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인 유럽의 머스크라인, MSC, CMA·CGM 선사들은 대표적인 가족경영(family business)회사들로 이들은 작금의 어려운 시황 하에서도 흑자를 시현하였는가 하면 대표적인 전문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3사는 적자운영 하에서 생존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생존력의 원동력이 전문경영이라기 보다는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 즉 ‘주식회사 일본-Japan Inc’ 정신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의 대형해운사들이 상생의 문화에 힘입어 장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는 지배구조상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해운사를 되돌이켜 보면, 외형상으로는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이 공존하여 오너경영인지 전문경영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된다. 특히 대형 해운기업일수록 그 한계가 애매하다. 오너경영, 가족경영인 듯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오너는 무한책임의 주체라기 보다는 경영의 감시자에 가깝고 그렇다고 전문경영인 체제 인가하고 들여다 보면 내면 깊숙한 곳까지 가족경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마디로 한국해운의 지배구조는 오너중심의 경영으로 전문경영체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큰 선사일수록 문패가 자주 바꾸어졌지만 중상위권 선사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건재하고 있다. 상위선사들의 문패가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M&A의 Key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너 혹은 대주주가 아닌 금융기관이었고 이른바 합리화의 모티브는 구제(salvage)차원이었다는 점이다. 외국의 M&A 사례처럼 양측의 대표가 협상을 거쳐 흡수 합병된 사례가 한국에서 단 한차례라도 있었던가.
호황일시에는 선가도 용선료도 높기 마련이고 불황일시에는 그 반대가 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때마다 고전하는 회사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즉 호황일시 고가로, 고 용선료로 선박을 확보 혹은 용선 하였다가 시장이 악화되면 흔히 하는 말로 떨이 매각(fire sale)을 하는가 하면 법정관리라는 배수진을 치고 선주를 상대로 용선선박의 조기반선이나 용선료 인하를 요구한다. 전형적인 Boom in, Burst out 현상이다.
호황시 전문경영인의 행보가 넓은데 비해 위기일수록 전문경영인은 움츠러 들기 십상이고 어제까지 회사를 이끌어가던 리더가 실적 저조를 이유로 물러서는 것을 보는 후배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축적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동안 오너가 위기관리를 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없지만 후임 역시 회사를 구하기 위한 나름의 전술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검증된 바도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보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전력을 재정비하여 위기를 돌파해나가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면서도 막상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오너 스스로가 시황 탓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성공한 오너 경영의 공통점은 단선선주로부터 시작하였고 해운이 모두가 all-in하는 주력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 해운이, 세계 최상위 유럽선사군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해운이 시간이 한가할 때 덤으로 하는 그러한 안이한 사업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해운시장에서 오너경영이 성공한 이면에는 암묵적인 오너의 무한책임경영과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는가 하면 실패의 이면에는 애매모호한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공생관계, 그리고 어려울 때 마다 양자간에 펼쳐지고 있는 Blame game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애매한 역할 분담이 두 가지의 강점만을 취합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으나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이 내재해있는 Hybrid형 경영이었다면 장래를 위해 이는 시급히 바로 잡아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 기자명 윤민현
- 입력 2016.03.31 14:48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