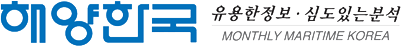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차게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지자체와 이를 거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국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항만업계에서도 기업이나 지자체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된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치’가 그렇고, 개장을 목전에 두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부산신항만의 명칭, 해묵은 투포트정책과 터미널운영사 독과점 방지책 논란 등이 그러하다.
이 문제들을 새삼 국익을 잣대 삼아 거론하는 것은 9월 23일 있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이익대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일부의원 때문이다. 의원들의 국감 활동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도 한다. 그렇지만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편협한 질의와 근거없는 책임추궁을 일삼는 의원들의 행태는 국감의 객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치와 관련, 인천지역 물동량 산정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두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예측물량이 상이한데 대한 집중질의가 있었는데. 그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연구자의 양심까지 매도하는 지역내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기도 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동량 예측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항만개발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것인 만큼 특정 지자체의 이익에 종속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부산신항의 명칭 문제 역시 국익을 잣대로 삼아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이 문제에 관한한 국감에서도 정부가 제때에 중심을 잡지 못한 탓에 부산시와 경남도간 지역갈등으로 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세계 5위의 국제항만인 부산항의 신항 명칭이야 말로 국익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지자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브랜드가치가 높은 명칭으로 합의하는 지혜를 모았어야 했다. 그동안 해양부는 지자체들의 눈치를 살피며 중재를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에 떠맡겼지만 이마저 수용되지 않아 또다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명칭으로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해묵은 투포트 논쟁은 국감장에서 “대표선수격 항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이 빌미가 됐다. 한 의원이 정부의 양항정책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평소 소신이냐며 따져 묻고 사과와 동시에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이 또한 민감한 지역주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지만 국가전체의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같이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익을 도외시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