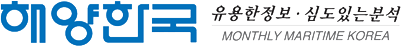불황기 국내 조선업계의 ‘구원투수’로 기대됐던 해양플랜트가 조선소 적자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플랜트 대거 수주로 불황기 곳간을 채우는데는 성공했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무리한 저가수주 경쟁으로 채산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의 해양플랜트 발주 침체로 그간 조선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혔던 해양플랜트가 벌써부터 ‘골칫덩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사간 과당 경쟁이 우선적으로 지양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경쟁국과 격차를 벌리고 ‘제 값받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8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선경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엄청난 발주물량을 쏟아내던 해운사들은 경영난으로 신조선 발주를 대거 중단·취소했고, 조선소들은 급격히 얼어붙은 수주량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더해 호황기에 무리하게 이뤄진 저가수주는 조선사의 경영난을 한층 더 악화시켰으며, 중국, 한국 등의 많은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메이저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유가는 꾸준히 상승흐름을 타고 있었고, 글로벌 오일메이저와 기업들은 심해 자원개발에 뛰어들던 시기였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대표 조선업체는 해양플랜트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처음에는 상선만 고집했던 현대중공업도 뒤늦게 해양플랜트 수주에 나섰다. 2010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대형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본격적으로 해양플랜트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드릴십은 거의 100%, 기타 선종도 70% 이상 국내 조선사가 독식하는 등 단시간내에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건조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시대가 열린지 4~5년 후인 현재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약 4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걸리는 해양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손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해양플랜트 인도시점부터 경영지표가 반등할 것이라던 예측은 빗나갔고, 우리 조선사들은 지난해와 올 1분기 ‘어닝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다.
건조초반 경험미숙·비용 산정 어려움 “수업료 냈다?”
이처럼 해양플랜트가 경영실적 부진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데는 해양플랜트 건조경험 미숙으로 인한 손익계산 실패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계약의 경우, 대부분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은 유럽 등 선진업체들이 도맡고 최종 건조작업만 우리 조선사의 몫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들이 직접 선택한다. 결국 최초 예상했던 건조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수업료’라고 생각했다”면서, “해양플랜트 진출 초기만 해도 비용산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당시 고유가와 심해 자원개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는 점도 비용산정이 어려웠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상선발주 급락으로 곳간을 채워야 했던 조선사들과 고유가와 유전개발 확대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던 오일메이저와의 ‘입장차이’도 저가수주의 원인이다.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인 08~09년은 상선 수주의 맥이 이미 끊긴 시점이고 조선사들은 당장 일감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당시 오일메이저는 철저한 ‘갑’이었다. 지금도 발주사의 입김이 강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조선사들이 ‘수주잔량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애초부터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끌고올 수 없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불황의 상황을 오일메이저들이 충분히 이용했고, 조선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는 해석이다.
국내 조선사 독식 시장 상황서도 ‘제 살 깎기’ 가격경쟁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조선사들간의 과당경쟁이다. 수주 초기의 비용산정 실패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간 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드릴십, 부유식 해양생산설비 등 규모가 크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들은 국내 조선사들, 소위 BIG3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수익은 물론 손해마저 감수하며 진행되는 저가수주는 이들간의 경쟁의 결과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 학계 관계자는 “해양 설비의 트렌드는 자주 변한다. 우리 조선사 수주분 중 유독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주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에 큰 금액을 책정하는 발주사는 없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사들은 발주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수주를 따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업체 페트로나스로부터 수주한 FLNG는 7억 7,000만달러, 그러나 지난 2월 삼성중공업이 동사로부터 수주한 유사한 규모 FLNG는 14억달러 수준이었다. 세부 계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가가 절반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드릴십 가격하락과 관련한 현대重의 사례는 업계에서는 유명하다. 과거 드릴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重이 진출하면서 대부분 건조했지만, 2011년 현대重이 뒤늦게 드릴십 시장에 뛰어들면서 드릴십 수주단가 하락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한 연구원은 “현대重이 드릴십 시장에 진출하면서 드릴십 단가가 낮아졌고, 최근 中, 싱가포르 등 신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단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重이 지난해 치열한 경쟁끝에 수주한 ‘에지나 FPSO'도 과당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초 동 계약은 현대重이 따낼 것이 유력시됐지만 계약 막판에 삼성重에게 넘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동 계약과정에서 현대重은 “삼성重의 계약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올 1분기 지난해 수주한 FPSO를 포함한 2건의 해양플랜트 공사에서 발생한 5,000억원대 공사손실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했다. 과당경쟁의 결과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삼성重이 수주한 VLEC(초대형에탄운반선)에 대해서도 저가수주를 의심하고 있다. 당초 동 계약은 현대重이나 대우조선의 경쟁이 예상됐었고, 선사와의 협상도 삼성이 입찰을 추진하기 전부터 현대와 대우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입찰에 참여한 삼성重이 최종 수주자로 결정됐고, 선가도 예상됐던 척당 1억 4,000만달러보다 낮은 1억 2,000만달러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重이 다른 초대형가스선에 비해 선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VLEC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선박으로 타 가스선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면서, “이미 수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언급하기가 껄끄럽지만, 애초 예상했던 금액에 다소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뜸했다.
“가격경쟁 만으로는 中에 못당한다. 기술 격차 벌려야 생존”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할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조선산업 연구자는 “당장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조선사의 입장도 있지만, 국내 업체끼리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보다는 고급 기술확보를 통한 제 값받기에 나서야 할때”라면서,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자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결국에는 중국의 물량공세에 당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일메이저 성향상, 경쟁자가 비슷한 기술력을 가졌다면 가격경쟁이 필요하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해양플랜트 시장이다. 오일메이저들은 업체의 경험과 신뢰, 기술력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렇게 맺어진 파트너에게는 거의 독점적인 대우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 상반기 해양플랜트 발주는 전년에 이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다. 클락슨에 따르면, 올 5월까지의 해양부문 발주액은 총 105억 달러로 2012년 897억달러, 2013년 288억달러에 이어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의 올해 수주목표액은 545억달러이지만 6월말까지 수주금액은 146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해양비중이 높은 삼성重과 대우조선은 각각 수주목표액의 26%, 13.1%를 확보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렇듯 우리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사업은 세계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강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남기지 못하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해양플랜트 발주전망은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Subsea 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엔지니어링 기술력 확보와 subsea 기술연구 등 발주 침체기동안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도 분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