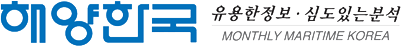김동규 에세이 Ⅱ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서해안, 간월도의 겨울 끝에 섰다. 타지의 저녁이 금방 어깨너머로 내려앉았다. 해안선과 긴 반도가 불타고 있었다. 해가 식기 전에 바다 위를 온통 검붉은 포도줏빛으로 물들인 노을은 졸지에 낯선 이방인을 황홀경으로 몰아넣었다. 감히 이르건대 낙조가 그리운 사람은 눈 딱 감고 서해로 달려가 볼이다. 명화같은 진경(珍景)을 보고 못보고는 일단 일진(日辰)에 맡길 수밖에 없더라도. 드디어 노을도 다 타버리고 어느새 낙도(落島)는 긴 터널 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다. 두어 시간 전에 건너온 섬은 마치 피안의 고도(孤島)처럼 무대 뒤로 서서히 스러져 갔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속에 둥근 달 하나씩 간직하고 있을테죠?”
법랍(法臘)을 가늠할 수 없는, 승복도 갖춰 입지 않은 스님이 선문답처럼 묻지도 않은 말을 내 얼굴에 던졌다. 간월도에 간월암, 달빛이 깃드는 절집이라. 달뜨는 야밤에 달빛이 들지않는 절도 있을까마는 이름 한 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자가 위치한 장소도 신비스럽다. 간월도(看月島)라는 작은 섬에 터 잡은 작은 암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전설만큼 고고한 섬이요, 처소다. 연꽃 같은 섬에 올라앉은 간월암은 밀물 때는 섬이 되었다가 썰물 때는 뭍이 된다. 하루 두 번 물길이 열려 뭍과 연결되고 나머지 시간은 육지와 단절된다. 밀물 때면 암자는 영락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림 같은 섬이 된다. 천수만 안에 외로이 떠 있는 섬. 해풍이 심할 때도 있을텐데 꿋꿋이 이겨냈음을 짐작한다. 아마 부처님의 자비심이 통하기나 한 것일까. 섬과 섬 사이로 달이 뜨는 간월도. 고적한 너의 초상(肖像)이 돌부처 같아라.
절집을 찾는 것도 인연의 힘일까. 그 스님을 바람처럼 만난 건 절 입구 안내판에서 암자의 유래를 훑어보고 난 뒤였다. 순간 방금 이 스님이 육백여 년 전에 이곳에 왕림하여 암자를 짓고 어쨌다는 바로 그 무학 대사가 아닌가 착각했다. 육백 년 영겁의 세월이 순간에 흘렀을까. 그는 부유하는 먼지처럼 휙 다가왔다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 버렸다. 아마 미물 같은 중생에 살가운 정을 나누기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람의 인연이 꼭 이와 같은 조화일까.
내가 이 바닷가, 이 섬을 처음 찾은 지 어느 새 얼추 20년이다. 아이들의 외가(外家)가 이 어촌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인연이 닿은 내 삶의 대척지(對蹠地).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뜨기가 충청도 서북녘 끄트머리의 농촌 아가씨와 혼인이 된 것도 이례적인 경우라고들 했다. 처음엔 처가 왕래가 외국 가는 길 마냥 멀고 아득했다. 워낙 효(孝)가 모자라고 게으른지라, 연중 두어 번 찾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렇게 짬을 내서 찾던 곳이 바로 간월도이다.
처음부터 간월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초행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원시, 그 미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물결따라 무질서하게 늘려 있는 자갈밭에 조개 굴딱지들이 지천으로 서식하는 갯마을이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일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횟집들은 흙먼지만 진눈개비처럼 펄펄펄 날리던, 한적하고 초라한 갯가였다. 간월도 어리굴젖 기념비랑, 바닷가에 투박하게 높이 쌓아올린 풍파막이 갯둑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한 시절이었다.
간월도에 대한 관심은 찾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깊어갔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뭔지 모르게 사람을 부르고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었다. 매력보다도 더 강한 어떤 힘, 마치 만유인력같은 끈끈한 당김이 없었던들 오래토록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낯선 곳에 대한 그리움인지, 오묘한 장소성인지 모를 특별한 감정이 깔려 있었던가 싶다.
거기에는 바다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섬이 있고, 어김없는 조석(潮汐)이 있었다. 연중 한날 한시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다. 천변만화의 바다는 늘 내 지친 삶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모성(母性)같았다. 달과 소통하며 터득한 밀물과 썰물의 운동은 바다를 늘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는 신통한 염력(念力)같았다. 잠잠한 듯 늘 움직이고 변하는 듯 변치않는 소우주였다, 바다는.
축복일까 불행일까. 최근에 찾은 간월암은 놀라보게 변해 있었다. 섬 속의 풍경도 변하고 절은 볼 때마다 탈바꿈하고 있었다. 태초에, 원시의 모습에서 절집을 짓기로 시작하여, 높고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집을 단단하게 치장하고, 2중 창문을 달고, 풍랑이 얼씬도 못하도록 축대를 보강하고…. 처음에는 스님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암자는 성벽처럼 투박한 절집이 되어 버렸다. 높다란 방파벽은 견고한 아파트 출입문처럼 안팎을 단절시켜 놓았다. 무시로 불어대던 해풍도 창문에 부딪혀 돌아가고 햇살도 반사되어 산란해 버린다. 뭇 탐사객(探寺客)들은 쇼윈도 쳐다보듯 겉구경만 하고 되돌아 갈 뿐이다. 아마 불변의 달빛도 절간 어디에도 머물다 갈 곳이 없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절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진다. 그나마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바다와 섬과 몇 그루 팽나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젠 바다도 온전할까 두렵다. 지도처럼 해도(海圖)가 시나브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깎이어 나가고, 갯벌은 전답으로, 대륙붕은 피서객의 휴양지로 개혁을 한다. 절집에서 바다건너 광활한 평야를 이루고 있는 천수만 간척지. 밀물이 드나들던 갯벌을 메워 넓디넓은 농지를 개척한 역사적인 대 역사(役事). 억겁의 세월을 다스려온 사연과 갯가 사람들의 애환이 묻혀 있을 신세계. 인간의 지혜인지 과오인지, 그 땅 위엔 무심한 철새들만 구름처럼 떼를 지어 세상을 노래한다.
탐사객이 모두 사라졌을 때, 석양에 물든 섬은 여전히 섬 그대로였다. 달빛을 타고 밀물이 밀려들었다. 심해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바다는 진리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묵언(?言)으로 일관하는 안거(安居)기간처럼 절집은 그야말로 절간이다. 바닷가 절집에서 몽환의 달을 쳐다보고 있는 나 자신만이 물음표처럼 외로이 서 있을 뿐이다.
해가 저물자 물결도 숨을 죽였다. 달빛이 해면 위를 표표히 흐르는 그 태초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유한과 무한, 존재와 허무 사이를 넘나들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섬과 바다가 변하듯이 진리도 세월따라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아찔했다. 순간의 방황을 추스르며 짧은 일탈로부터 되돌아왔다. 오랜만에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를 보았네. 바닷가에 긴 다리로 서 있는 물새처럼,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어느 시인의 사념(思念)처럼.
지구는 오늘도 자전을 멈추지 않았다. 간월의 겨울이 멋있기로서니 나는 지금도 회색의 원시가 그립다.
................................................................................
김동규(金東奎)
* 58년 경남 남지 生. 수필전문지《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 외항선 일등항해사. 동아대 대학원 언론학 석사.
* 현재 한국해기사협회《월간 海技》편집인. 《해양과 문학》편집위원.
* 부산문인협회, 한국해양문학가협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